발생 일주일…현장 긴장감 여전
주민들, 평소 둘 사이 갈등 인지
“살려달라 소리쳐 몇 차례 신고”
애틋하던 할머니 모습도 기억
“손자를 나쁘게 말한 적 없어”
주변 상인 “물건 계산하던 손자
반응 느렸던 듯…해코지는 안 해”
할머니가 우리 사회에 보낸 위험 신호는 분명 존재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징후를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고, 참극은 막지 못했다.
노인 학대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이웃 주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여파를 살피고,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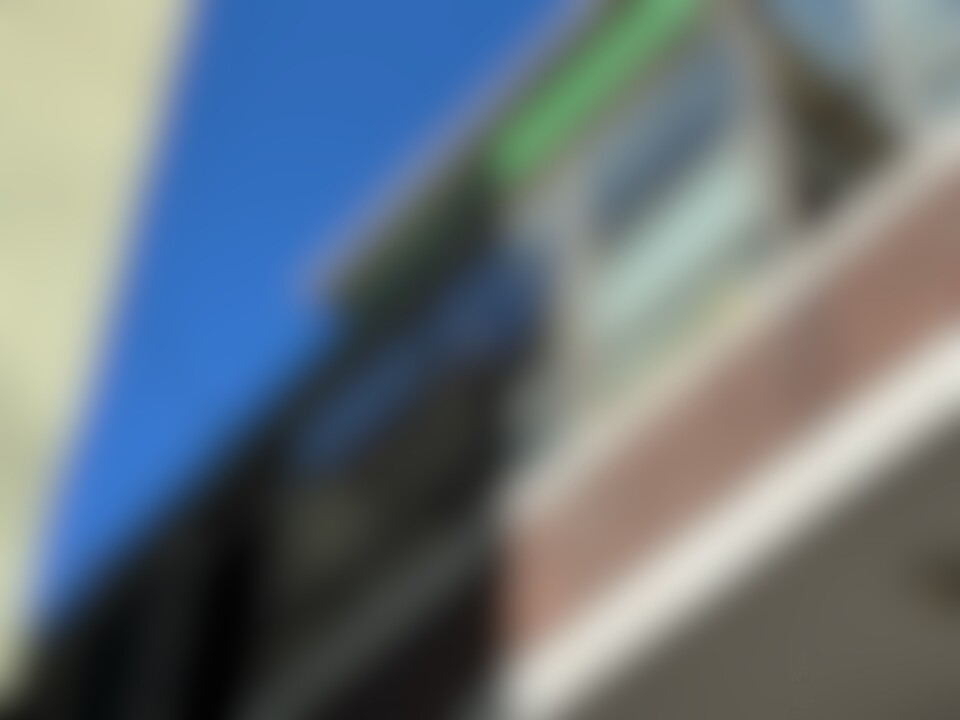
다세대주택 3층 은색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건이 있었음을 알리는 노란 폴리스라인도 모두 걷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마음 한 켠에 쌓인 불안과 안타까움은 한 덩어리 앙금으로 남았다.
18일 오전 10시쯤 인천 부평구 한 다세대 주택 앞.
지난 7일 70대 할머니와 함께 살던 20대 손자가 할머니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곳에서 만난 정모(72)씨는 “처음엔 왜 과학수사대 차량이 이 동네에 몰려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유를 알고선 충격이 컸다”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며 살고 싶은데 바로 주변에서 이런 사건을 접하게 돼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좀 더 적극적인 관계 기관들의 개입이 있었으면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 그래서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크다.
주민 A씨는 “몇 년 전 할머니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걸 듣고 경찰에 몇 차례 신고한 적이 있다”며 “여름엔 창문이 열려 있어 말다툼하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다”고 기억했다.
이어 “당시 고3이던 손자가 할머니의 상체를 발로 찼다는 말을 할머니에게서 직접 들은 적도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이들 간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할머니와 손자 간 다툼으로 경찰이 세 번 출동했고, 세 차례 모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관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인천일보 11월14일 7면 [단독] ““노인 학대” 세 차례 신고에도 끝내 참극”>
정반대의 모습으로 둘을 기억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주민 B씨는 “할머니가 손자를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다”며 “손자를 정말 아끼는 것처럼 보였는데, 둘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비닐봉지로 꽉 묶은 반찬통과 냄비들. 할머니 가족들이 발인 후 정리한 유품 아닌 유품들이 할머니집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주변 상인 C씨는 “손자가 물건을 계산할 때 반응이 느린 모습이 있었다”며 “해코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언급했다.
/글·사진 이창욱·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