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말 인천항 빈민 고달픈 삶
현덕, 단편소설 '남생이'에 눌러 담아
월남전 땐 미군 고철 속 부속류 찾아
일당 벌려다 포탄 폭발로 목숨 잃어
추락·부상 무릅쓰고 해상 하역 작업
악천후 속 작업 강행하다 참사 발생
해면 저목장선 목피 벗기려다 사고
항만 확장 여파 '맨손어업' 밥줄 끊겨

지난 주 제48화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항만 인근 거주민들의 몇 가지 불편함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삶의 현장을 인천항 부두에 둔 사람들, 혹은 그 언저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드러나지 않은, 혹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이야기들을 하려 한다.
굳이 이런 이야기로 이 연재의 마무리를 하는 것은, 수많은 이름 없는 부두 사람들, 부두 근처 사람들의 씁쓸하고, 서글프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어쩌면 이 항구를 오늘의 모습으로 환하게 서 있게 한 그 뒤편의 음영(陰影)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번히 쓰레기꾼이란 정작 볏섬도 산으로 쌓이고 낙정미도 많이 흘려 있는 지대조합 구역 내에는 얼씬도 못 하고, 목채 밖에 지켜 섰다가 벼를 싣고 나오는 마차가 흘리고 가는 나락을 쓸어 모은다. 그러나 기실은 구루마 바닥에 흘려 있는 나락을 쓸어 담는 척하고 볏섬에다 손가락을 박고 치마 앞자락에 후비어 내는 것을 본직으로 꼽는다.
그러다 들키면 욕바가지를 들쓴다. 쓰레받기 몽당비를 빼앗긴다. 앙가슴은 떠다박질리고 채찍으로 얻어맞는다.
인천항 소금 하역 인부로 있다가 폐결핵으로 누운 남편을 대신해 매일 미곡 하역장에 나가 낙정미(落庭米)를 비로 쓸어다 호구(糊口)를 잇던 '쓰레기꾼' 노마어머니가 등장하는 단편소설 '남생이'의 한 대목이다. 이 소설은 인천 출신 현덕(玄德, 1909∼미상)의 작품으로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항구가 있으면 이렇게 그 그늘에 목매고 사는 외진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노마어머니도 그런 사람의 하나였다. 1930년대, 인천항에서 볼 수 있었던 이 같은 눈물겨운 풍경 뒤에, 끝내 들병이로 전락하고 마는 노마어머니의 어두운 실루엣이 어른거린다.
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했지만, 기실 이 내용은 당시 인천항에서 볼 수 있었던 항구 뒤편의 풍경이었다. 소설가 현덕의 탁월한 구성력과 솔직하고 과장 없는 필치가 1930년대 말엽, 인천항에 매달려 사는 근처 빈민들의 현실 삶을 직접 목격하는 듯 아주 생생하게 서술해 놓았다.
소설에 나오는 이 같은 이야기, 목숨 부지를 위한 그 비슷한 일이 근래에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광복을 거쳐 6·25전쟁을 겪으면서 인천항으로 구호양곡이 입하되던 시절, 한 줌 곡식을 위해 노동자들이 옷 속 깊숙이에 작은 주머니를 달아 거기에 곡물을 넣어 가져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 같지 않은, 차라리 그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 진정 웃을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 역시도 이 부두에 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월남전 때, 전쟁 고철을 들여오면서 소총은 물론 장갑차, 탱크도 고철 속에 섞여 들어왔다는 인천항 8부두에 얽힌 옛 이야기다. 한진상사가 월남에서 크게 활약했던 까닭에 몇백t씩 미군 전쟁 물자를 고철로 수입할 수 있었으니 혹 그런 사례가 있었을는지 모른다. 더구나 당시 신문지상에는 이따금 고철 속 포탄을 잘못 다루어 일어난 폭발 사건을 보도하는 것으로 보아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닐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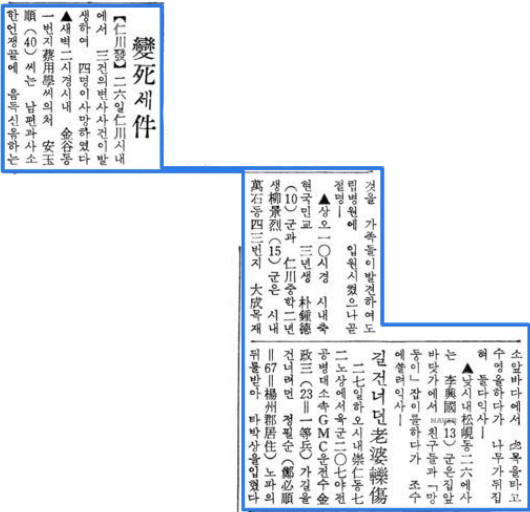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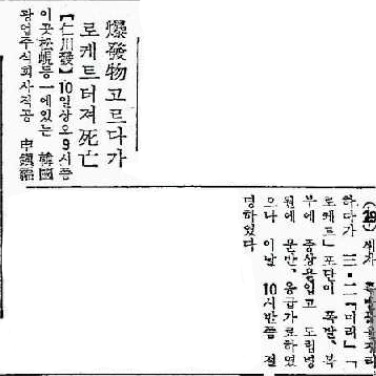


아무튼 고철 수요처인 인천제철(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고로(高爐)로 직행해야 할 이 고철 중에 차량이나 장비에 쓸 만한 부속류를 주워 숭의동의 공구상가에 가져다 팔면 짭짤한 일당벌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인천항은 그 그늘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근처의 어느 기자는 인천항 원목 하역 작업을 '목숨을 건 노동'이라고 했다. 과거 원목 하역은 외항에서 작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좁고 불편한 인천항의 부두 여건, 곧 체선·체화 때문이었다.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 물결에 흔들리는 부선에 거대 중량물인 목재 하역 작업이라면 목숨을 건다는 말이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역 노동자가 바다에 추락하거나 원목에 부상하는 안전사고가 흔히 발생했으니…. 남의 사정이라 말은 쉽게 목숨을 건 노동이라고 하지만, 당사자 하역 노동자들은 결코 목숨을 걸고서 그날 아침 출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목 하역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해상 하역 작업은 지난 시절 흔한 일이었다.
1957년 4월 14일 오전 4시 때 아닌 강풍으로 월미도 앞바다에서 작업 중이던 한성기업 소속 한일호(27톤)가 전복되었는가 하면 이날 상오 8시에는 조선운수 인천지점 소속 제1강남호가 57명을 승선시키고 외항에 정박한 본선에 접근하려다가 전복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천항운노조에서 발간한 '인천항변천사'의 구절이다. 한성기업의 한일호는 선박 간의 충돌로, 제1강남호는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벌이려다가 전복되어 승선자 57명 중에 고작 11명만 구조되었다는 참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과 하루 일자리를 놓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이런 어둡고 참혹한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항구나 바다가 직접 삶의 현장이 아니었던 민간인 사고도 많았다. 과거 목재회사들이 육상 저목장(貯木場) 외에 해면 저목장이나 인근 바다에 원목을 그대로 띄워 놓던 시절에는 일반인들의 사고도 종종 일어났다.

유실(流失)을 막기 위해 철사로 원목들을 고정해 놓기도 하지만 물결에 부침(浮沈)하면서 절단되는 경우가 흔했다. 1959년 7월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만석동 모 목재회사 앞 해상에서 원목더미 위에 올라가 수영하던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소년이 원목과 원목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익사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 인근의 세민(細民)들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원목의 목피(木皮)를 벗기려다 비슷한 사고로 부상하거나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이야기 역시 인천항 주변에 남아 있다.
항만 확장과 매립으로 인천항 주변에서 흔히 보아 오던 개펄 조개잡이, 이른바 '맨손어업'의 주인공들도 다 사라졌다. 또 시민들은 으레 그런 것이려니 하고 살았지만, 바다와 항만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살던 시절도 있었다. 항만 경비 및 보안관리 지침을 내세워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던 정보기관의 서슬 퍼런 위세와, 부두 사진 한 장도 정보기관이 내세운 전담 사진사의 손에서만 얻어야 했던, 실로 바다도 항구도 시민에게는 없었던 씁쓰레했던 시절! 1993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단계적 개방이 시작되었다.
수없이 많은 부두 뒷이야기를 이루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버젓한 거대 국제항구의 밝은 이면에는 이런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 잊힌 이야기들이 어둠처럼 도사려 있다는 사실이다.
/김윤식 시인·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