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부활을 앞두고 전국행정체제를 개편할 당시 서울분할론이 등장했다. 서울특별시를 서울시와 강남시로 나누자는 주장, 강북시·강남시·영등포시로 3분 하자는 주장, 동서남북 4개시로 쪼개자는 주장 등 여러 설이 분분했다. 서울분할론은 자치론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자당 내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안이었다. 전 인구의 5분의 1이 전체 면적의 0.6%에 몰려 사는 건 불합리하다는 합리적 판단이 서울분할론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서울분할론은 김영삼 대통령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쑥 들어가고 말았다.
약 한 세대쯤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서울확장론이 불거졌다. 김기현 전 여당대표가 불을 지폈다가 사그라지는가 싶더니, 뒤를 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는 동시에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 김포 구리 하남 광명 부천 등을 서울로 편입시킨 다음 경기남부도와 경기북부도로 3분하겠다는 얘기인가?
서울은 일제강점기 이래 계속 커졌다. 1936년 공업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영등포를, 필수적이지만 외곽에 두어야 할 도시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 동쪽 고양군의 여러 면을 편입시켰다. 1949년에는 북쪽과 동쪽으로 경계를 크게 늘렸고, 1962년 말에는 막연히 장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영동(영등포 동쪽) 즉 지금의 강남 일대와 서쪽, 북동쪽 땅을 확보했다. 1973년 구파발 일대를 편입시킨 이후 일부 경계조정은 있었지만 대규모 확장은 없었다. 1995년 서울분할론이 등장한 것은 과밀 부작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는 1992년 1097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서울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구는 경기도가 넘어갔다. 성남-용인 쪽부터 악명높은 난개발에 시달렸다. 경기도 인구는 2003년 서울을 추월했다. 1967년 300만 수준이었던 경기도 인구는 35년 만에 1000만을 훌쩍 넘어섰다. 이후 인구증가 속도는 어질어질할 정도다. 2010년 1200만, 2015년 1300만, 2023년 1400만을 돌파했다. 1995년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수도권의 과밀 해소 방안을 물어야 할 시점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방향이 '메가서울'이라니, 동의하기 어렵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마냥 슬프지 않으려면 무엇이 서울-경기 윈윈 하는 길인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올해 목련은 그냥 툭 질 수밖에 없을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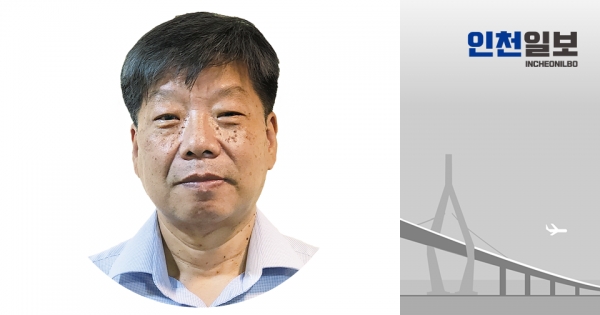
/양훈도 논설위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