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도구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든가 떨어져야 하건만 '내려오기'는 사다리의 기능으로 치지 않는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비유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지난 대선 때 여야 가리지 않고 주요 후보는 모두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보장하거나 다시 놓겠다고 약속했다. 아뿔싸, 내려가기 기능만 보면 한국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는 대형 물놀이장 슬라이드만큼이나 잘 작동 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빠르게 사회적 약자(취약층, 소수자)의 삶이 팍팍해질 리 없다.
연초에 사회학자 조형근이 <녹색평론> 겨울호에 쓴 글 “더 좋은 경쟁논리 대신 반전의 시대정신을”을 인상 깊게 읽었다. 사다리라는 은유가 함축하는 경쟁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상기시키면서, 혼자 오르는 사다리는 치워버리고 함께 걷는 연대의 정신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펼쳐졌다. 코로나19 첫 희생자였던 청도대남병원 코호트격리자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중증장애인 시범사업 담당 장애인 활동가, 12년간 한국에서 일한 기능인이자 멋진 이웃이었으나 끝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사다리 비유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육박해 들어간다.
“사다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오를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당신은 사다리를 혼자 올라간다. 그 결과 노동계급과 공동체의 연대감은 약화되고, 위계라는 독을 달게 만든다.” 레이먼드 윌리엄스(1921~1988)는 일찍이 사다리 비유의 덫을 갈파했다. 좌파의 관점일 뿐이라고?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좌파 사상가이므로 당연히 그럴 테지만, 문제는 좌우가 아니라 그의 지적이 정확한가 여부다.
한국사회를 보라. 각자도생의 시대에 모두가 기를 쓰고 사다리를 오르려고 애쓰는 동안 구성원 대다수의 삶은 더 가파른 벼랑 쪽으로 더 내몰리는 게 사실 아닌가? “약자의 목록은 계속 추가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거대한 악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만이 아니다. 우리를 각각의 소수로 고립시키는 분열의 논리를 직시해야 한다.” (조형근)
그나저나, 한국사회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수리·복원하는 일이 가능하기는 할까? 가능조건은 뭘까? 공정한 심판? 엄격한 룰 집행? 차라리 게임 리셋이 빠르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광범위한 연대가 없으면 복구 운운 자체가 말짱 헛소리다. 그리고 일정한 합의와 연대가 형성되면 사다리는 사실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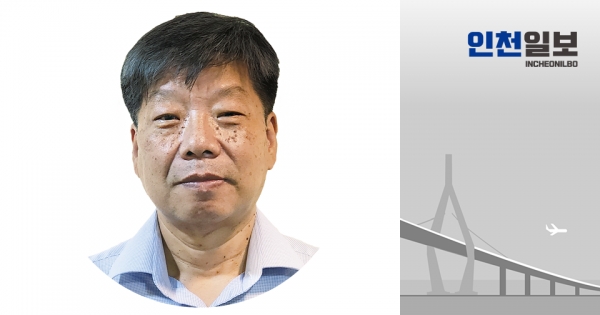
/양훈도 논설위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