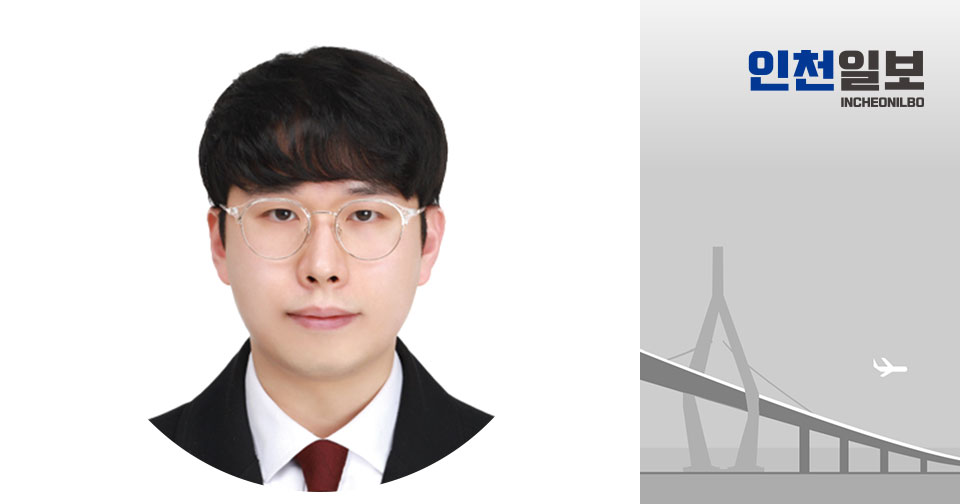
“저어새는 참 못생긴 것 같아요”
“저어새도 기자님 보고 못생겼다 생각할 걸요?”
얼마 전 인천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그의 대답을 듣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어쩌면 저어새를 비롯한 야생 동물들이 인간을 피하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못생겨서가 아닐까 하는 상상도 했다.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다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인간은 서로에게 낯선 존재다. 조류 연구자나 환경 운동가가 아니면 저어새를 만날 일이 극히 드물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만날 일도 많지 않은, 생전 얼굴을 마주 볼 일도 없는 저어새를 보살피려고 노력할까. 그저 인간들의 탐욕으로 그들의 집과 먹이를 빼앗은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한결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들은 저어새가 없는 환경에서는 인간도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살면서 볼 일이 많지 않은 멸종위기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는 인간의 생존 역시 달려 있다. 우리는 서로를 못생겼다고 여겨 피할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끈끈하게 연결된 존재다.
영국의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은 생명 다양성을 '거미줄'로 비유했다. 거미줄 1∼2가닥이 끊어지면 전체 거미줄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생태계도 특정 동·식물 종이 사라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5월 20일. 남동유수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저어새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다. 한국에 와서 터를 잡은 저어새 가족을 축하해주는 날인 동시에 우리가 사는 환경을 되돌아보는 날이다. 이날을 맞아 저어새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의 안녕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안지섭 사회부 기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