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안전망이라는 은유와 마주치면 언제나 서커스단 공중그네가 먼저 떠오른다. 까마득해 보이는 높이에서 아슬아슬 곡예 그네 저 아래로 성긴 그물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광대 역할을 맡은 이가 일부러 손을 놓쳐 바닥으로 떨어질 때면 어린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거대한 트램펄린에서 뛰어 오르듯 솟구쳐 무사하다는 몸짓을 해 보이는 광대에게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쳐댔다. 언젠가 공중그네에서 떨어진 곡예사가 허술한 안전그물 때문에 추락사했다는 보도를 접했던 날 꽤나 오래 멍 했던 기억이 난다.
지난 21일 발견된 '수원 세 모녀'의 공영장례가 26일 치러졌다. 그리고 열흘 동안 한국사회의 찢어진 사회안전망에 대한 다양한 질타와 반성이 줄을 이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이다. 헌법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직후에도 무수한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찾아가는 사회복지'라는 패러다임이 그 때 등장했으나 지난 8년 동안 몇 발짝 떼지 못했다는 진실이 '수원 세 모녀'의 비극으로 폭로되었다.
여기저기서 “재발 방지!”를 외치는 소리가 또다시 높다. 당연하다. 기울 곳은 깁고, 새로 짤 부분은 다시 만들어서 라도 또 다른 '세 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정상국가 정상사회일 터이다. 사회안전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소용돌이 한국사회는 발인과 동시에 망인들을 애써 잊고 벌써 다른 이슈로 눈길을 돌리는 듯하다.
사회안전망은 추락 방지를 위한 심리적 장치일까, 추락한 이후를 위한 안전장치일까? 사회안전망이라는 은유에는 두 의미가 모두 담겨 있으나, 한국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후자로 한정하고 있다. 행여 추락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로 복귀토록 돕는 장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는 국민들의 숨만 붙어있도록 하는 그물이라면, 한계가 명백하다. 쏟아지는 대안 상당수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20년 전 남편(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가 '수원 세 모녀'를 괴롭히는 부당한 상황이 왜 계속되었을까. 암과 희귀성 난치질환은 어디서나 부담 없이 치료 받는 시스템이었는데도 이들이 벼랑 끝으로 몰렸을까. 재발방지도 재발방지지만, 추락 위기에 몰린 이들의 신음에 최대한 반응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 정치 경제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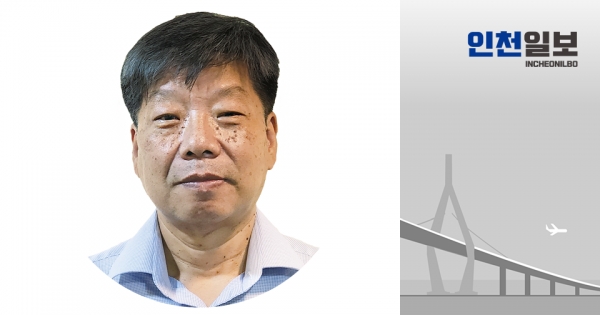
/양훈도 논설위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