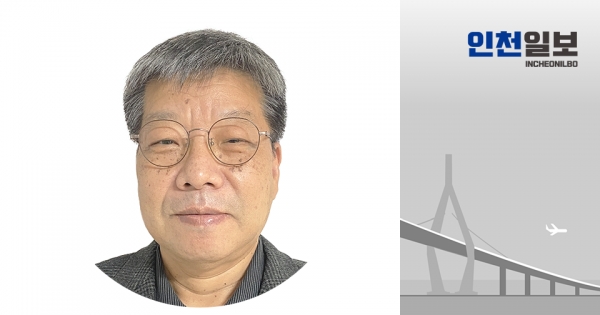
창밖 빗줄기가 제법 굵어졌다. 어제부터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는 제법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한 가뭄으로 모내기에 애를 먹었다는 수도권에도 해갈 수준으로 내려주시면 좋겠다. 평생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절기마다 잠시 농사를 생각하는 버릇이 끈질기다. '꼰대'스러운 상투적 의례일 수 있으나 나쁘지 않은 습관이라 여긴다. 올해는 6일이 망종이다.
망(芒)은 까끄라기를 가리킨다. 까끄라기는 벼나 보리의 낟알에 달린 수염 같은 가닥인데, 줄여서 까락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망종이라는 절기의 뜻은 '까끄라기 곡식의 때' 쯤 될 터이다. 이맘때가 보리 베고, 모 내기 알맞은 시기라는 의미겠다. 보릿고개가 사라진지 오래고, 비닐 모판이 보급되어 모내기 시기도 소만 무렵으로 보름 정도 앞당겨져서, 망종 자체가 잊힌 절기가 된 듯하다.
지금은 까끄라기라는 말 자체가 낯 설기만 하다. 까끄라기 달린 벼 낟알 자체를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까끄라기는 벼농사의 기계화와 다수확에 성가시고 불편하기만 한 존재로 여겨져서 품종 개량 과정에서 진즉에 제거되었다. “보리까끄라기도 쓸모가 있다”는 속담이 흔적기관처럼 모국어에 전해지기는 하는데, 일상에서 써 본 기억은 없다. 하찮고 보잘 것 없어도 쓰일 데가 있다는 뜻이다.
토종벼 재배와 보급에 앞장서는 우보농장 이근이 대표가 쓴 글을 보니, 벼의 까끄라기는 원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부분이었다. 수분을 저장하고, 새가 낟알을 쪼아 먹는 걸 막으며, 낟알이 바람에 멀리 날려가 씨를 퍼뜨리도록 돕는 역할이 벼 까끄라기의 기능이었다는 것이다. 근대 농법이 보급되면서 증산이라는 인간의 목적이 벼의 쓸모를 압도해 버렸다.
토종벼의 까끄라기가 오방색이었다는 점도 퍽 흥미롭다. 자라는 곳의 토양과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 청 황 백 흑 색깔을 띠었다니 신비롭기까지 하다.
음양오행에 맞추려다 보니 오방색이지, 자연 스펙트럼으로 치면 훨씬 더 다양한 색깔이었을 것이다. 토종벼는 문헌으로 확인되는 품종만 1450여 종이다. 토종벼가 사라지기 전, 한반도 가을 들녘은 저마다 다른 색깔을 뽐내는 벼의 까끄라기 덕에 마치 색채 점묘화 같은 장관을 연출하지 않았을까? 황금들녘도 흐뭇하지만, 다양성이 살아 있는 들녘도 못지않게 아름다웠을 터이다.
금나, 붉은차나락, 돼지찰, 까투리찰, 대궐도, 홍두나, 각씨나, 버들벼……. 낯서나 왠지 정겨운 토종벼 이름을 되뇌어 본다. 모든 논이 다시 토종벼 농사 시절로 되돌아가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잊혔던 토종벼를 되살리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작은 희망이고 위안이다.
/양훈도 논설위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