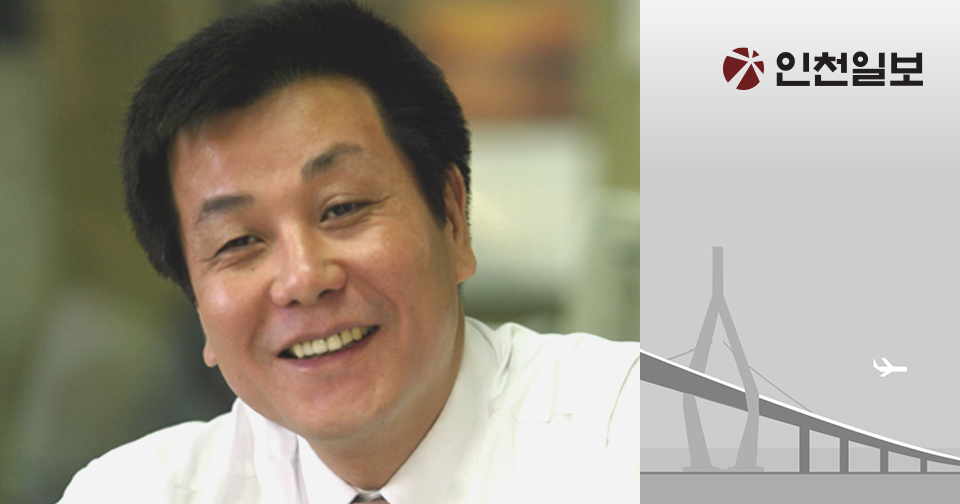
밀가루 반죽을 방망이로 얇게 밀어서 칼로 가늘게 썰어 만든 국수. '칼국수'의 사전적 풀이다. 칼을 도구로 써서 만드니, 그럴 만도 하다.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썰어내는 방식은 아주 일반적이다. 짜장면·우동·소바·파스타 등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이야 칼국수를 '별미'로 즐기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끼니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배가 고프던 시절이었다. 쌀밥을 먹기 힘들 때, 칼국수는 이집 저집에서 흔한 음식이었다. 밀가루 원조로 그 값이 매우 저렴했던 이유도 한몫을 했다. 나이 지긋한 연배에선 어려웠던 때 그 맛이 그리워서, 젊은 세대에선 뭔가 새로운 맛을 찾는 듯싶다.
요즘은 가게나 지역에 따라 칼국수 요리가 정말 다양하다. 국물의 양상이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다. 멸치·바지락, 닭고기·사골, 된장·팥을 넣어 맛을 내는 등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재료 사용과 함께 맛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식도락가들의 입을 즐겁게 한다. 방송에선 때때로 칼국수 하나로 부를 쌓은 맛집을 소개하기도 한다.
인천에도 한때 칼국수로 이름난 곳이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1970년대에 중구 신포동 55 일대에 '칼국수 골목'이 형성됐다. 처음엔 한 가게가 칼국수를 싸게 내놓아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맛도 그렇지만, 저렴한 값에 뜨끈하게 배를 채우기엔 그만이었다. 이 집이 호황을 이루자, 잇따라 칼국수집들이 문을 열었다. 9곳이 경쟁할 만큼 잘됐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이르러 주위 환경에 밀려 하나둘씩 폐업을 하면서 명맥을 잃어깄다.
신포동 칼국수집들은 '독특한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튀김가루를 '고명'으로 듬뿍 올려 칼국수 맛을 차별화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요리법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신포시장 닭강정 가게 등에서 나오는 튀김가루를 응용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그리고 한번 먹어본 이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지인과 함께 다시 찾기 일쑤였다.
중구가 이렇게 역사를 담은 신포동 칼국수 골목 활성화에 나서 주목된다. 문화체육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침체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자 마련했다. 구는 이미 7억원을 들여 칼국수 골목 일대 6개 건물을 사들인 상태다. 구는 먼저 1940∼50년대 지은 건물을 정비해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을 비롯한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벌일 수 있게끔 꾸민다고 한다. 칼국수 골목 이야기를 전시할 공간과 야외쉼터 등도 조성하기로 했다.
중구엔 역사적 가치를 띤 곳이 많다. 그러니 사업을 살필 때 보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번에도 최대한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할 듯하다. 칼국수 골목 경관과 역사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문일 논설위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칼국수와 사람' 이라는 주제로 스케치를 해보라고.
무플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