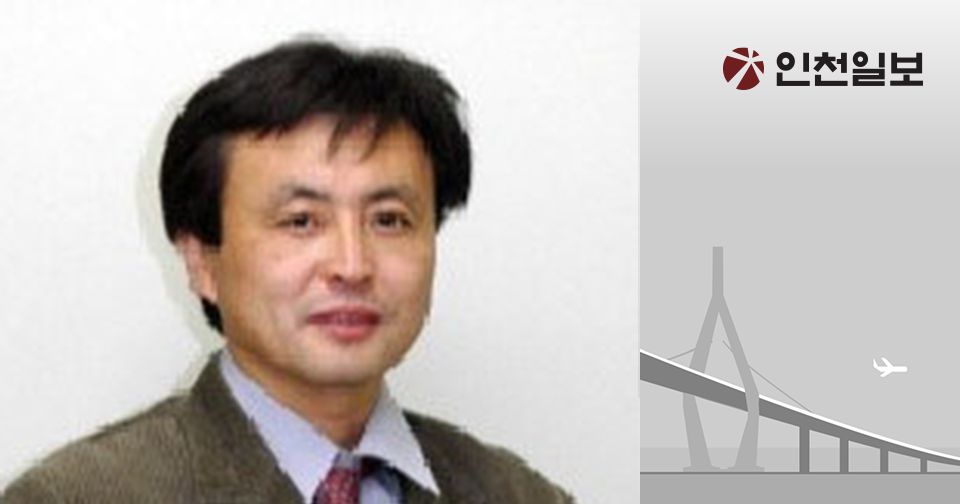
선거가 끝나면 늘 등장하는 말들이 있다. 승리한 정당이나 국회의원 측에서는 '국민의 위대한 선택' '국민들의 승리' '거역할 수 없는 민심'이라는 수사(修辭)를 내놓는다. 패배한 측도 잊지 않고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식의 논평을 발표한다. 하지만 진심이 담겼다기보다는 립서비스나 다음 선거를 기약하는 책략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안다.
사실 국민에 대한 덕담이나 치켜세우기 만큼 무난한 정치행위는 없다. 말 한마디만 잘못 해도 낭패를 보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민은 정도 이상으로 칭찬해도 문제될 일이 없다. 정치의 기본인 위민(爲民)의식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에도 이만큼 효용있는 수법은 드물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정치인들이 또 다시 어떤 식으로 '국민'을 들먹일지 귀가 간지러울 때가 많다.
그러면 정치인들의 말대로 국민은 늘 위대하고 이성적일까. 불행히도 역사는 이를 부정한다. 국민이 현명한 판단이나 행동을 할 때보다는 선동·이용당하거나 우민(愚民)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의 지성으로 간주되는 인사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은 선거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독일 국민들도 나치 등장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국민은 책임 있는 공중(公衆)과 무책임한 대중(大衆)의 두 얼굴을 하고 있다. 공중은 “공공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합리적인 판단·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다수의 사람”을 의미하며, 대중은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를 구성하며, 개인간의 상호작용이나 집단적인 규범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으로 수동적·감정적·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진다. 대중의 또 다른 특성은 이기주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고 하는 것이 대중이다.
그러나 공중과 대중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국민은 시대적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공중이 될 수도, 대중이 될 수도 있다. IMF사태와 같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회사가 망할 것이 뻔한데도 봉급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노조원도 국민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에서 “군주가 국민의 뜻만 추종하면 그들과 함께 망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고 밝혔다. 과격한 말이지만 국민의 부정적 측면을 짚고 있다.
민주당 및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정책이 현란하기 그지없다. 당연히 '포퓰리즘'(비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워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대중주의나 인기영합주의로 불린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들은 서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지만, 대중이 보기에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김학준 논설위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