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롄쿠이 지음·김태성 옮김 '복지사회와 그 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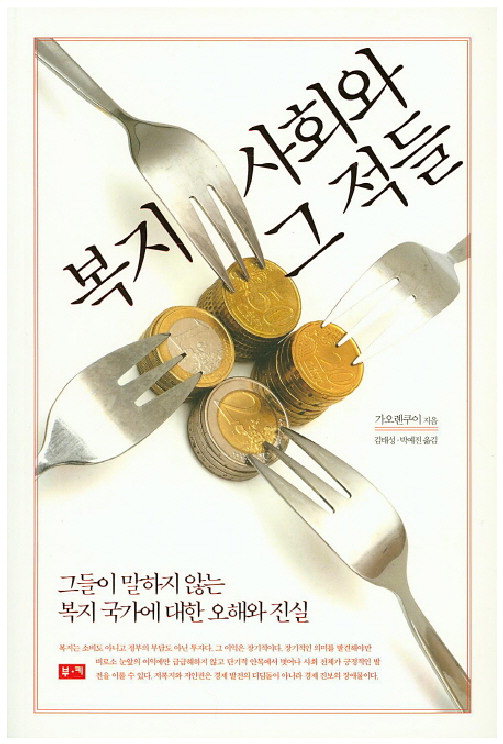
홍콩 경제학자 "복지만이 살길" … '정책 확대 반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최근 몇 년간 복지는 한국 사회의 주요한 이슈였다. 선거철만 되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복지 공약을 앞세웠고, 선거 이후에도 "어떤 복지인가"라는 질문에 각기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일방 중단 결정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초·중·고교생이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떠나, 선별적 복지나 증세 문제 등 한국 사회의 복잡한 이념적·경제적 지형도를 그려냈다.
보수 정당과 언론들은 ▲복지 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복지사회는 저효율을 야기한다 ▲복지국가는 실패했다 ▲복지사회는 시민적 자유를 훼손했다 ▲복지사회는 국가 부채를 늘린다 ▲복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등의 논리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신간 <복지사회와 그 적들>은 이러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복지국가만이 지속가능한 발전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홍콩 루이쿠연구원 부원장인 경제학자 가오롄쿠이가 펴낸 이 책의 원제목은 <위기에 처한 세계>(世界如此危机). 책에서 저자는 자본주의로 구축된 세상이 점차 부의 편중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高)복지 정책은 소비축소를 막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력도 강해진다고 말한다.
저자는 "복지 사회는 지금까지 인류가 창조해 낸 가장 효율이 높은 발전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국가의 모델로 꼽히는 북유럽 5개국을 보자. 이 나라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요약되는 사회 보장체계가 수립돼 있지만, 시장경제 체제가 약화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수요 부족으로 불황에 빠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위기에도 탄력적으로 대처한다. 정부가 청렴하고 시민의 인권이 강조되는 것도 이 국가들의 특징이다.
일각에선 복지 사회가 부유한 사회의 특징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견해다. 독일이나 북유럽 5개국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부유해진 다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시절부터였다. 이들은 사회 복지 제도를 수립한 뒤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저자는 일찌감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 싱가포르만이 사회 보장을 건국의 기초로 삼았고 그 결과 중산층 사회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복지 사회가 건설될 경우 유일하게 손해를 입는 계층은 고위 기득권층인 탓에 최대 반대자가 된다고 말한다. 복지 사회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물론 자본가와 정부에도 이득이 되지만, '사회 전체의 유·무형 자원을 통제'하는 '고위층'만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다.
이들은 종종 '감세'를 주장해 시민의 공감을 얻지만, 감세는 결국 부유층의 배만 불린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해 결국 중산층 해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말이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옮김, 부키, 416쪽, 1만8000원
/김상우 기자 theexodu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