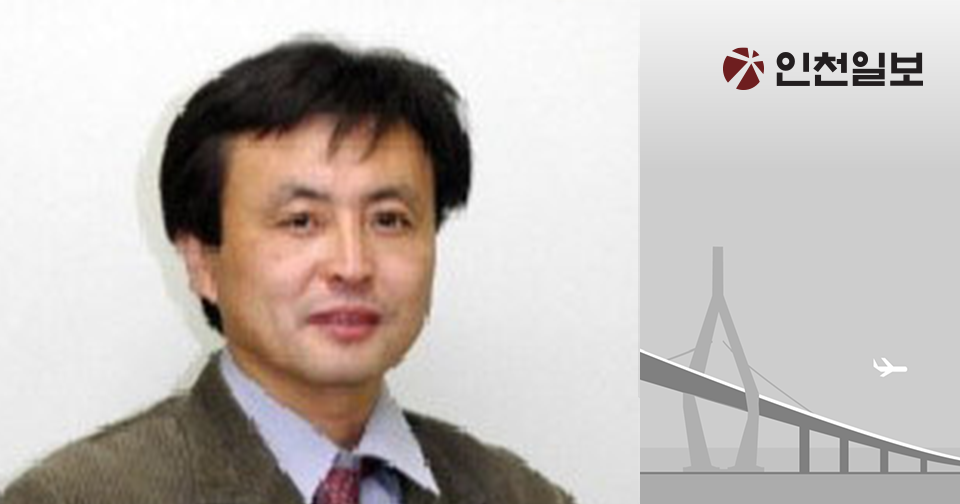
갑질은 10여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황당하고 해괴한 갑질이 연일 등장하고 있다. 갑질의 진화인지, 엽기화인지 헷갈린다. 대법원은 갑질·폭행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의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생마늘 한 움큼을 강제로 먹이고, 직원들의 머리 염색 색깔을 자신이 정한 뒤 염색하도록 했다. 또 사내 메신저에 휴대전화를 엿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사찰했다.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마사회장은 측근을 채용하려다 인사 담당 직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정부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X야. 내가 장관 만나서 그 자식 모가지 잘라버리라고 할 테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꼴리는 대로 해”라고 했다. 귀가 의심스럽지만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다. 갑질인지 시정잡배인지 분간이 안된다.
경기도 북부청사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 레이스 달린 옷, 원피스 등을 입지 말라면서 각서를 요구했다. 한번 찍히면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혀 못 견디고 그만둔 교사가 2년 동안 9명에 달한다. 한 교사는 “원장님만 보면 가슴이 뛰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진다”고 말했다.
갑질의 속성은 특이하다. 갑질로 인생이 망가진 경우를 수없이 봤음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건 학습효과도 없는 모양이다. 정부 국민신문고에는 '갑질피해 신고센터'가 있다. 공식 제도에 일종의 비속어(갑질)가 등장한 것은 그만큼 일반화됐다는 얘기다. '갑질'이라는 말은 2010년쯤 인터넷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반짝했다가 곧 사라지는 유행어와는 달리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갑질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대중의 분노가 들끓고 벌집을 쑤신 듯한 소동이 벌어지지만 갑과 을의 구도는 그대로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질 한번 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갑질은 계속된다. 21세기 미스터리다. 갑질 속성을 인간 DNA와 결부시키는, 과격한 시각도 있다. “자기 제어력이 없는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으로 치부하기에는 천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을'의 자세를 나무라는 견해도 있다. 철학자 니체는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재빨리 영합하는 자, 개처럼 툭하면 벌렁 드러눕는 자, 독성 있는 침이나 사악한 눈길도 받아들이는 자, 지나치게 인내심이 강한 자”라고 비꼰다. 고상하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철학자와는 달리, 살아내야 하는 현실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과언으로 들리겠지만, 한번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다.
/김학준 논설위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