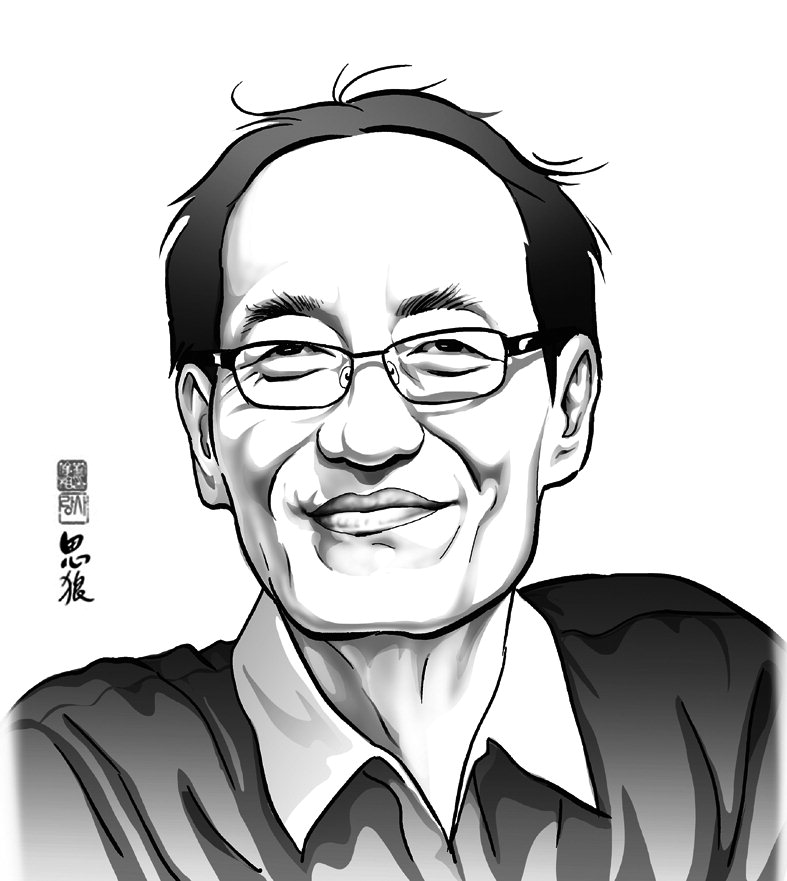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을 조용히 넘겼다. 여느 휴일과 다름없이 모처럼 긴 연휴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누렸다. 명절이 '긴 연휴'로 등치된 건 부모 모두 작고한 뒤부터다. 이후 명절의 권위는 반토막났다. 번잡한 의식 역시 시간이 흐르며 자연 소멸됐다. 세대의 교체와 세태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 과정이다.
누군가는 설의 기원을 2000년 전으로 내세운다. 부여가 정초에 제사를 올리고, 죄수를 풀어주는 제천의식을 치른 걸 근거 삼는다, 신라 때도 설날 잔치를 베풀고 일월신을 배례했다는 기록이 있다. 일련의 기록은 세월에 씻겼거나 누군가 입맛 따라 편집·가공됐을 거다. 조선후기 홍석모는 이를 모아 한 권 책에 담았다. '동국세시기'란 그의 책은 제사, 금기, 의복, 음식 등 여러 분야의 세시풍속을 집대성했다. 오늘날 설에 등장하는 다례나 설빔, 복조리 등은 물론, 총 46가지 풍속과 의식, 음식 등이 기록돼있다는 걸 보면 당시 설의 규모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천천히, 오래도록 이어져온 설의 권위는 태양력 도입으로 흔들렸고, 일제 강점으로 균열이 생겼다. 해방 후에도 복원되지 못한 설이 부활한 건 90년 만인 1985년. 그나마 어정쩡한 '민속의 날'이란 이름으로 공휴일이 됐다. 설이 제 이름 되찾고, 3일간 긴 연휴가 된 건 1989년. 오늘날 같은 설을 맞게 된 건 고작 30년쯤 되는 셈이다.
그 새 세상은 빠르게 달라졌고, 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일가친척이 모여 제례의식 갖고,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서의 의미조차 퇴색하고 있다. 서울대 김영민 교수는 대놓고 "명절 때 기분 좋아진다는 사람 못 봤다"며 "각자 방식대로 즐기는 게 좋다"고 말한다. 심지어 "명절이란 산 자들의 서열이나 권력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 정의한다.
굳이 그의 말을 들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미풍양속이란 우아한 수식에 감춰진 것들은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듯하다. 오래 된 것들에 대한 애틋함이야 남겠지만, 애틋함을 감당하는 것 또한 저마다의 몫이니 말이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