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인천시교육청 장학관

다니엘 페낙
문학과지성사
교육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 가을하면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독서의 계절이다. 학교에서는 9월이면 각종 다양한 독서행사를 벌인다. 2015년 가을을 여는 9월의 인천은 특별하다. 바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책의 수도'이기 때문이다.
거실을 서가로 만들자는 캠페인이 한창 유행을 탄 적이 있다. 모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이 독서운동단체와 함께 벌인 독서문화운동의 일환이었다. 많은 가정들에서 텔레비전이 추방되었다. 텔레비전이 있던 자리는 서가와 책으로 채워졌다.
이 운동은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책과 친해질 수 독서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
북스타트, 한 도시 한 책 읽기, 아침독서, 북크로스 등 그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온갖 독서문화운동이 근래 들어 차례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의 독서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독서문화운동을 활발하게 벌인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사회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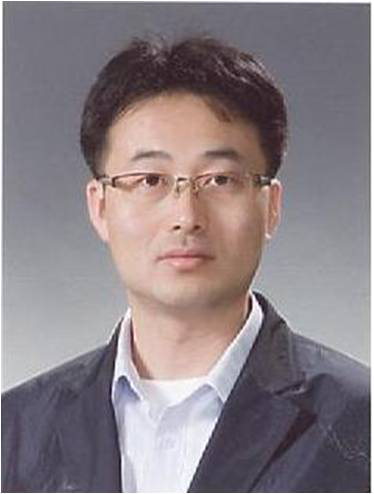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읽어야만 하는 책'은 그리 매력적인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독서가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약간의 회유를 곁들인 강제적인 독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그 아이에게 독서는 더 이상 행복한 경험이 아니다. 행복한 독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독자가 될 수 없다. 아이들을 자연스레 행복한 독서의 길로 인도하는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주는 책 중의 하나가 바로 다니엘 페낙의 '소설처럼'이다.
'소설처럼'은 독서의 즐거움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 머리맡에 앉아, 예전처럼 다시 아이와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책을 골라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크게 소리 내어 읽는 것이다. 유년시절의 그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선물과도 같다. 어른은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다. 호기심을 우격다짐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권하고 있다.
다니엘 페낙은 '소설처럼'에서 10가지의 재미있는 독서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리가 '책을 읽지 않을 권리'이며 마지막 열 번째가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이다.
두 가지 모두 행복한 책 읽기로 나아가는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주는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만 좀 읽어라, 눈 나빠질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제발 나가 놀지 그래.", "불 꺼! 책 좀 그만 읽어, 늦었다!".
'소설처럼'과 함께 책과 독서에 관해서 지혜를 주는 책으로는 이권우의 '호모 부커스', 박영숙의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 성석제의 '책, 세상을 탐하다', 앤 패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 ', 강승숙의 '선생님 우리 그림책 읽어요', 장석주의 '만보객 책 속을 거닐다', 잭 캔필드의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젠틀 매드니스의 '책,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 강명관의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로버트 다운스의 '교과서가 죽인 책들', 귀뒬의 '도서관에서 생긴 일'등이 있다. /이성희 인천시교육청 장학관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