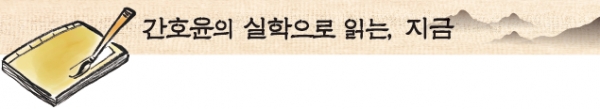

노랫소리와 함께 사면에서 창귀(倀鬼)들이 쇠몽둥이 하나씩 들고 뛰쳐나오는 데, 동에서는 굴각이요, 서에서는 이올이, 남에서는 육혼이 우루루루- 금수회의소로 들이닥치며 소리친다. “범님이 오셨다!” “범님이 오셨다!” “범님이 출두하옵신다!” 두세 번 외치는 소리가 벽력 치듯 나니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고 땅이 푹 꺼지는 듯, 천둥소리와 창귀소리가 산천을 진동시켰다. 금수들이 겁을 내어 이리뛰고 저리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타리에 자라처럼 대가리를 들이민 놈, 시궁창에 떨어진 놈, 오줌 지리고 애고대고 우는 놈, 대가리 감싸 안고 쥐구멍으로 숨는 놈에 벼라 별 놈 다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허우대 큰 놈이 머리에 쓴 금빛 찬란한 큰 관 내동댕이치고 오색영롱한 법복에 똥 싸 퍼질러 앉아 뭉개며 고추 따면서 똥 싸는 척 의뭉스럽게 하는 놈이라.
범님이 그 커다란 범 눈으로 쓱 훑어보더니, 그놈은 제치고 울타리에 쥐새끼처럼 대가리를 틀어박고 있는 놈을 데려 오라 하였다. 검은 망토를 걸치고 몸을 들까불며 깐죽깐죽 말하던 시궁쥐였다.
“이놈 네가 법 좋아하는 놈이렷다. 공자님은 ‘배운 공부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게 병이(學道不能行者 謂之病)’라 하셨지. 네놈이 바로 법척(法尺,법 자)을 들고 설치며 병든 놈이로구나. 왜 네 주변은 그 법척을 들이대지 않니. 그러니 병이 든 게야. 썰어봤자 한 됫박도 안 되는 주둥이로 낄 때 안 낄 때 설레발치며 나서서는 깐족이는 대사 쳐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대중의 눈길을 받는 건 도리 없다만, 너는 조연일 뿐임을 명심해야한다. 법가인 한비자(韓非子)가 「망할 징조(亡徵)」에서 국가 멸망 징조 47가지 중, 첫째가 바로 ‘군주의 권위는 가벼운데 신하의 권위가 무거우면 망한다(權輕而臣重者 可亡也)’라 했다. 명심하렷다. 에끼! 입맛 떨어진다. ‘겸손’이란 두 글자 좀 쓰고 읽을 줄 알렴. 이 놈 내치거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육혼이 간교한 웃음으로 알랑거리던 땅딸하고 목이 없는 여우를 잡아와 “그럼 요놈은 어떠신지?”하니, 범님은 흘깃 보더니 이맛살을 잔뜩 찌푸렸다. 말도 하기 싫다는 표정으로 “이 물건 저리 치워버려라!”하며 손을 홰홰 저었다. 이번에는 이올이가 저쪽에서 오줌 지리고 애고대고 울던 얌생이를 끌어왔다. 범님은 아예 눈길 한번 주지도 않고 손사래를 쳐 저 멀찍이 갖다 내쳐버리라 했다. 그러더니 어마지두에 놀라 오색영롱한 법복에 똥 싸 퍼질러 앉아 뭉개는 석법지사놈을 데려 오라했다. 굴각이가 코를 막고서 석법지사를 끌어다 범님 앞에 놓으니, 범님이 오만상을 찌푸리고는 대갈일성한다.
“네 이놈! 내 너를 정의를 외치는 깨끗한 놈이라 하여 잡아먹으려 왔더니. 이름만 석법지사(碩法之士, 큰 법을 지닌 선비)지, 이제 보니 석 자는 돌 석(石)자요, 사 자는 사기칠 ‘사(詐)’자 아닌가? 백성을 큰 제사 받들 듯해도 모자라거늘 오히려 백성을 능멸의 대상으로 보고 무책임과 무정견으로 일관하면서도 양심의 부끄러움조차 모르니 선비는커녕 모양새는 개잘‘량’ 양자에 개다리소‘반’ 반자 쓰는 ‘양반’놈에 똥감태기렷다. 아, 제 호의(縞衣,흰 저고리로 아내를 말함)조차 건사하지 못하는 놈이 뭐 금수들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거랑말코 같은 인격으로 헛소리나 지껄이고 주먹이나 내지르며 뭐, 공정‧정의‧상식‧법치를 말해. 네가 국선생(麴先生,술)을 좋아한다지만 어디 네 깐놈이 선생의 곁에나 가겠느냐. 술에 취하는 것은 그나마 국선생이 봐주지만 권력에 취하면 멸문지화를 당해. 너는 내게 오금을 저린다마는 백성들은 네 무례하고 저속한 언행의 정치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혹한 정치가 범보다 더 무섭다)’라 하며 나보다 네 놈의 3불인 불통(不通)‧부도덕(不道德)‧부조리(不條理)와 무능(無能)‧무지(無知)‧무식(無識)‧무례(無禮)‧무책(無策)인 5무 정치를 더 무서워한다. 지식이 없으면 입이 가볍고 경험이 없으면 몸이 가벼운 법, 네가 늘 법법하니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다. ‘법지불행 자상범지(法之不行 自上犯之)’라.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너처럼 윗대가리에 있는 놈들이 법을 어기기 때문인 걸 모르느냐? 네 주변부터 청정무구 법을 실현한다면 그게 백성들에게는 이목지신(移木之信, 지도자의 믿음)이거늘, 너는 오히려 그 반대 아니냐. 상앙(商鞅)이 후일 거열형(車裂刑,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에 처해짐을 되새김질해 보아라. 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네 어리석고 구린내가 역해 도저히 못 먹겠다. 이놈의 옷을 모조리 벗겨서는 저 심심산골 토굴에 위리안치(圍籬安置) 시키거라.”
이러며 노려보는 범님의 눈알은 등불 같고 입에서는 불길이 나오는 듯하여 석법지사는 혼백이 나가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이러할 제 창귀가 두 물건을 끌어다 놓았다. “하, 요놈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벌써 이 금수회의소를 벗어나 줄행랑치는 걸 잡아왔습니다.” 범님이 고개를 획 돌려 이빨을 부지직 갈며 교와 활을 내려다보았다. “하! 요것들이 문젯거리로군”하더니 먼저 교를 쳐다본다.
“이놈! 네가 교활(狡猾)의 ‘교’란 놈이로구나. 누의(螻蟻, 땅강아지와 개미) 같은 쪼고만 깜냥으로 능갈맞게 자칭 ‘법사’니 ‘멘토’니 하는 짓이 요사스럽기 그지없더구나. 꼭 저쪽 나라를 망국케 한 그리고리 라스푸틴(Grigory E. Rasputin, 러시아를 망국으로 이끈 요승)이란 물건에 버금가는 놈일세. 청천백일에 젊은이들이 생죽음을 당했는데, 뭐라고, ‘참 좋은 기회’라고. 이런 사악한 놈! 벌렸다하면 악을 내뿜는 그 주둥아리를 닥쳐라. 이놈이 인두겁을 쓴 음흉한 물건이렷다.”
그러고는 이제 교활의 ‘활’을 쏘아보았다.
“네 이 암상맞고 요망한 물건아! ‘마등가(摩登伽, 불교에 나오는 음탕녀)가 아난(阿難, 부처님의 10대 제자)을 어루만지듯’ 네가 사내를 내세워 세상을 희롱하려 드는 게냐? 네가 있는 한 이 나라 희망은 감옥에 갇힌 장기수요, 절망은 바람을 타고 온 나라로 퍼진다.…”
범님의 호령은 마치 끝없이 넓고 큰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하고 천리 먼 길에 천리마가 치달리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내 너희 두 종자를 먹어치워 후환거리를 없애야 겠다”하고는 우쩍 달려들어 한 손에는 ‘교’를, 한 손에는 ‘활’을 움켜잡아서는 “으르렁!” 입맛을 다셨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여명(黎明)이 희붐하게 비쳐오고 있었다. (22~25 연재 끝)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문학박사):인하대학교 초빙교수·고전독작가(古典讀作家)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