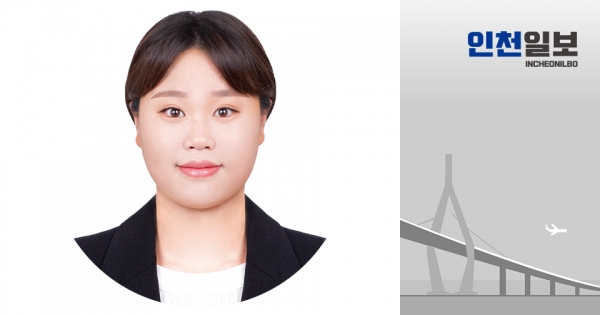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9일 인천 중구 중산동에 사는 한 주민은 수화기 너머 “집에 찬 물을 빼내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또 침수됐는데, 이제 지긋지긋해요”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7월 한차례 장마가 왔을 때 침수 피해를 입었던 민가인데, 복구가 채 완료되기 전에 또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곳에 거주하는 한 70대 노인은 침수로 인해 망가진 옷들을 세탁한 후 볕에 말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에 젖어버렸다. 젖은 빨래처럼 축 늘어져 기운이 없어 보인 것도 잠시 빨래를 걷는 노인 손이 빨라짐과 동시에 분노도 함께 터져 나왔다. 몇 년 전 집 옆에 자리 잡은 밭이 성토로 인해 높아졌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땅 주인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침수가 날 때마다 달려오는 구청 관계자들도, 카메라를 들이밀고 취재하는 언론사들도 미덥지 않다고 했다.
해결을 원한다고 했다. 더 이상 보금자리가 물로 차오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8일과 9일 사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일대에 물폭탄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상습침수구역 거주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관할 지자체는 “언젠가는 개발될 지역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영종은 미개발된 농촌 지역과 개발지역이 공존하는 곳이고, 지금은 신도시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했다. 그 때문에 민가 주변의 땅 주인이 땅을 성토한다 한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땅 값어치를 높이는 행위를 막을 재간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인천 곳곳 저지대 주택과 빌라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들은 재난이 앗아갈 일상에 두려움을 느낀다.
재난은 불평등하다면 이를 완화할 대안은 지자체가 고민해야 한다.
/박해윤 사회부 기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