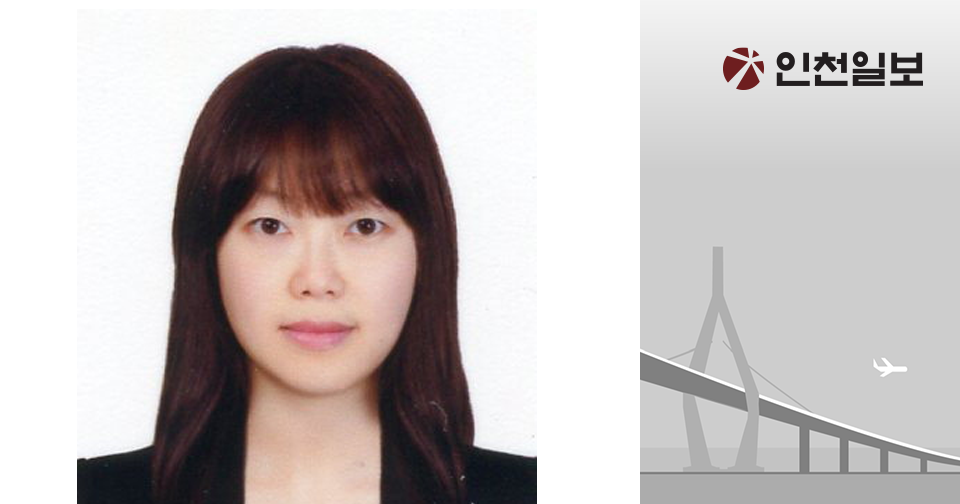
196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배호의 삶은 짧고도 처연했다. 1942년 독립투사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일찍 아버지를 여읜 그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렵게 음악을 시작했다.
20대에 접어들어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로 최고 인기스타가 된다. 지금도 전설인 그의 창법은 당시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들과 달랐다. 전통 팝 음악에서 나오는 중후한 저음을 배호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으로 강조하고 절정부에서 애절한 고음을 구사하는 방식이었다.
가창력 뿐 아니라 그의 '힙'한 스타일도 선풍적이었다. 늘씬한 몸매에 세련된 슈트를 차려 입고 당시 생소했던 금테안경을 썼다. 그가 출연하는 무대에는 언제나 구름같은 관중이 몰려들었고 방송사 가수상은 모두 휩쓸 정도로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배호의 스타 인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발표하기 1년 전인 1966년 신장염에 걸렸으며 치료와 재발을 거듭하다가 1971년 11월7일 숨을 거뒀다. 고작 스물 아홉 살이었다.
모진 병과 싸우며 호흡마저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배호는 작품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누가 울어',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마지막 잎새', '0시의 이별' 등이 모두 병상에서 부른 노래들이다.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싶을 때는 직접 무대에도 섰다. 음악평론가 임진모는 당시 배호와 인연이 깊었던 이의 기억을 인용해 그를 회상하는 글을 썼다.
“다른 가수와 그토록 잘 어울렸던 사람이 이 무렵에는 하루가 다르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대기실에서도 드러누워 있는 적도 많았다. 그러다가 1970년 광주(光州) 태평시네마 공연에서는 급기야 무대에 서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다. 10대 가수 모두가 무대에 등장했지만 배호는 분장실에서 누운 채 신음소리로 “노래를 못하겠어요”라고 했다. 사회자였던 나와 이대성은 무대로 나와서 “배호씨가 아픕니다. 출연이 곤란합니다”고 객석의 양해를 구했다. 배호의 인기가 절정인 상태였고 출연 펑크가 빈번했던 시절인지라 관객들도 양보를 하지 않았고 “우린 배호 보러왔다! 안 나오면 돈 물어내라!”며 막무가내였다. 객석의 상황을 들은 배호는 “그럼 무대에 나가야지요” 하더니 내게 “좀 부축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다. 그래서 배호는 내 등에 업힌 채, 이대성이 들고있는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해야만 했다. 순간 나는 코끝이 찡했고 배호는 눈물을 흘리며 열창했다.”
올해는 이런 배호의 서거 50주기다. 지난주 인천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길오페라 주최로 그의 노래를 다시 불러보는 음악회였다. 주최 측은 배호와 인천의 인연에 주목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배호가 해방 후 고국으로 들어와 처음 산 곳이 인천 중구이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운 지역이 부평이라는 것이다.
배호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외삼촌에게 드럼을 배우면서 악단생활을 시작한 곳이 바로 부평 미군부대 클럽이었다. 그는 부평에서 2년 정도 지낸 것으로 보인다.
짧다면 짧은 관계지만, 인천은 그와의 시간을 사랑하고 아꼈다. '배호 가요제'를 처음 시작한 곳도 인천이고 연안부두에 노래비와 흉상을 세워 그를 기리는 것도 인천이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음악도시 인천'은 신중현, 김홍탁, 한명숙을 비롯해 배호가 부평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터전을 닦았다는 점에 주목, 관련 콘텐츠가 하나의 갈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배호는 자신에 대한 인천의 관심에 화답이라도 하듯 애정어린 노래를 하나 남겼다. 바로 '비 내리는 인천항 부두'다. 이 노래 가사와 곡조엔 배호 특유의 서글프면서도 처절한 감성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가 자라고 지낸 인천이 불꽃처럼 찰나를 살다 간 자신을 잊지 말기를 바라듯 말이다.
보슬비 내리는 인천항부두
오고가는 연락선에 사랑도운다
기막힌 사연만 남은항구야
조수처럼 왔다가 가는사람아
아~ 아~ 아 인천항 부두에 비만내린다
이별도 서러운 인천항부두
떠나가는 뱃머리에 사랑도운다
갈매기 짝잃은 인천항구야
고동처럼 울다가 가는사람아
아~ 아~ 아 인천항 부두에 비만내린다
/장지혜 문화체육부장 jjh@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