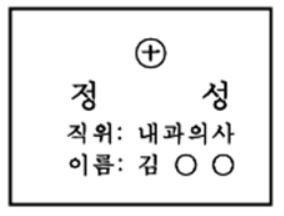
일반 사람들은 흔히 의사라고 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바로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일 것이다.
환자들이 그리는 ‘꿈의 의사’는 유능한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사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째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자신의 이익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이기를 바란다.
북한에서 보건일꾼이나 의사, 약사로 일하다 들어온 북한출신 주민들에 의하면 북한의 의사는 기자재가 없고 약이 모자라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환자들을 대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의사들은 뭔가 북한하고 다르다고 말한다. 그 근간은 무엇인가? 바로 ‘정성정신’으로 설명한다.
문자 그대로 환자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것으로 이 ‘정성 정신’은 1961년도 6월 7일 전국보건부문 일군 열성자회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요체는 보건일꾼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희생을 발휘해서 치료에 힘을 다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비록 의사가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는 않지만 ‘정성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정성명찰을 달게 되었다. 단지 의사 등 보건일꾼들이 명찰을 다는데 그치지 않고 이 정신에 입각하여 현장에서 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대가성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감동적인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실천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북한의 약사 출신인 이혜경 박사는 한국에 온 보건 일꾼의 일화를 기록하였는데, 수많은 화상 환자들이 생기는 탄광 지역에 근무하는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에게 피부를 이식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심지어 병원 성원은 물론 일가족까지 평균 3~4점의 살점을 떼였다고 한다. 그중에는 허벅지 피부로도 모자라 팔의 피부까지 최고 10여 점을 이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1990년대 배급제가 중단되면서 이러한 정성운동은 변질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에 의사들이 자신의 살을 떼어주고 뼈를 깎아주면서 환자들에 대해 헌신적으로 대했던 정성정신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정서의 근간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북한 보건 분야에서 희미하나마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성운동의 요체를 오늘날 우리의 머리로나 가슴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북한의 의사가 오늘날 한국의 의사들과 만나 대화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해진다.

김화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